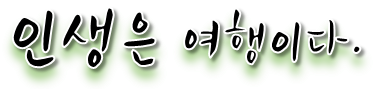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을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길에 동행하고 싶은 우주 입문자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 아닐까 하는 『경이로운 우주』라는 책을 다시 읽는다.
골치 아픈 끈이론이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등에 관한 책을 읽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고 우주를 영화 보듯 즐기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펴보기에 좋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브라이언 콕스(입자 물리학자)와 앤드루 코헨(영국 BBC 방송국 과학팀 팀장)이다.
브라이언 콕스는 「E=mc²」 이야기와 「퀀텀 유니버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물리학자다.
이 책은 BBC 방송국의 과학다큐멘터리 시리즈「 경이로운 우주(Wonders of the Universe) 」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 메신저
2. 우주의 먼지
3. 낙하
4. 운명
우주의 나이는 137억 살, 크기는 대략 450억 광년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메신저
우리는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보고 느낄 수 있을까? 우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빛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오랜시간 관찰하여 계절의 변화와 시간, 방향을 알아내는데 활용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지구는 태양계의 3번째 행성이며, 태양계는 우리은하의 용골-궁수자리 팔에서 갈라져 나온 오리온 자리에 속해 있다. 우리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 평균 두께는 1000광년이다.
영의 이중슬릿 실험으로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 정체는 맥스웰의 방정식을 통해 빛은 전자기파임기 밝혀졌고 그 속도 또한 299,792,458m/s 임을 알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론을 통해 누구에게나 동일한 속도로 나타나는 '특별한 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진행 방향과 공간의 진행 방향은 다르고 시간 여행도 불가능함을 밝혔다. 질량이 없는 물체는 공간 속에서 무조건 이 특별한 속도로 움직이고, 질량을 가진 물체는 모두 이보다 느려야 한다.
빛의 속도는 시공간과 얽혀 있는 기본 상수이며, 그 값은 우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질량은 가진 모든 물체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동일한 속도로 움직일 수도 없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 우주에서 과거와 미래는 섞이지 않으며, 과거로의 시간여행도 불가능하다.
인간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별빛의 적색편이로 부터 우주의 팽창을 역산하여 137억 5천만년 전의 대폭발 '빅뱅'을 통해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빅뱅우주론은 마이크로파 우주배경복사(CMB)로도 증명되어 진다.
약 5억년 전의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우리의 조상들은 빛을 인지하는 기관을 발달시켰고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인지하는 기관인 눈을 통해 심우주로 부터 지구로 쏟아지는 별빛을 분석하여 우주의 기원과 비밀을 쫒고 있다.
2. 우주의 먼지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 존재의 기원은 무엇일까?
입자물리학자들은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우주의 만물이 12종의 기본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냈다. 이 중에서 우리 몸을 포함하여 지구의 모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를 세 종류 뿐이다. 바로 업-쿼크(up-quark), 다운-쿼크(down-quark) 그리고 전자(electron)이며 이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다시 세상에 존재하는 수소, 탄소, 산소, 철, 금, 은 등의 화학원소를 구성한다.
현대 과학에서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은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별의 삶과 죽음을 이해할 때 찾아온다고 한다. 바로 생명의 순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곳곳에 분포한 성운들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한다. 이렇게 탄생한 별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빛을 발산한 후 생명이 다하면 적색거성(red giant)이 되었다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다. 덩치가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 후 블랙홀이 되기고 하고, 가벼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 후 중성자별(neutron star)이 되기도 한다. 아주 가벼운 별은 최후의 순간에 초신성 폭발을 겪지 않고 적색왜성(red dwarf)가 된다.
멀리 떨어진 별의 구성성분은 별빛을 분석하여 알 수 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별 빛이 흡수된 검은 선(프라운호퍼선)을 통해 대기의 구성성분(특정 원소마다 전자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정해져 있어 성분을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130억년 전 빅뱅을 통해 탄생한 우리 우주는 대폭발 후 아주 짧은 시간에 급속한 공간의 팽창과 함께 온도가 내려가면서 대칭성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하나로 뭉쳐있던 초힘(superforce)은 중력, 강한핵력, 전자기력과 약한핵력이 차례로 떨어져 나와 지금과 같은 4개의 힘으로 분리되었다. 뜨거운 에너지 수프로 가득차 있던 우주에 쿼크, 반쿼크, 전자 등이 생겨나고 온도가 더 내려가면서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로, 다시 전자와 결합하여 수소와 헬륨 원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겨난 수소와 헬륨들이 중력에 의해 다시 뭉쳐 별이되었다가 핵융합 반응으로 점점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원소기호 26번 철(Fe)까지 만들어진다. 그 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과 같은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져 우리 우주에 흩뿌려지고 이들이 다시 뭉쳐 행성과 생명의 탄생을 만들어냈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우주의 먼지로 부터 온 것이다.
3. 낙하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중력, 전자기력, 강한핵력, 약한핵력 4가지다. 강한핵력과 약한핵력은 원자 핵의 구성요소에만 작용한다. 전자기력은 전기와 자기를 작동시키는 힘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引力)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거시세계는 모두 중력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수소와 헬륨이 중력으로 뭉쳐 만들어진 별, 별들이 모여 만들어진 은하들, 별의 삶과 죽음에서 만들어진 원소들과 생명까지도 모두 중력의 작품이다.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은 비를 내리게 하고 강물과 해류가 흐르게 하고, 화산과 용암, 협곡을 만들어 냈다. 우리 태양계에 존재하는 행성과 위성과 혜성들도 모두 중력의 영향으로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 우리은하인 은하수에 존재하는 모든 항성과 행성들도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 궁수자리 A*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중력에 관해 처음 수학적 이론을 완성한 물리학자는 아이작 뉴턴이다. 실로 아름답고 완벽한 이론이었으나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수성의 움직임이 관측치와 이론의 예측치에 오차가 생기면서 이론의 한계가 들어나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을 완성한 후 몇년 후 일반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면서 사고실험을 통해 중력과 자유낙하가 완전히 같은효과를 낸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하고 휘어진 시공간은 중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하고 그에따라 물체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의 GPS도 이 시간오차를 보정해 주지 않으면 오차가 계속 늘어나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도 적용할 수 없는 곳이 우주에 있으니 바로 블랙홀이다. 한계 질량을 넘어선 중성자별이 쿼크의 축퇴압을 압도하여 수축하면 블랙홀이 된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을 넘어서면 빛조차 블랙홀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블랙홀의 중심부에서는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된다. 중력이 무한대라는 얘기다. 이런 특이점(Singularity)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블랙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력이론은 과연 나올수 있을까? 물리학계의 진정한 천재들이 매진하고 있는 끈이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다면 일반상대성 이론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4. 운명
빅뱅 이후 우주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화해 왔다. 우리는 아직 시간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주의 시작과 끝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는 어떤 끝을 맞이할 운명일까?
우주에서 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행성, 모든 별, 모든 은하는 그 중심의 별, 블랙홀, 은하 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번 돌고, 태양은 은하중심의 궁수자리 A* 블랙홀을 2억 2500만 년에 한번씩 회전한다. 지구의 나이가 45억년이므로 우리는 블랙홀을 중심으로 20바퀴쯤 공전했다.
시간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이것이 바로 에딩턴경이 말한 '시간의 화살'이다. 시간의 화살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엔트로피(entropy)'의 개념이다. 우주의 발생 가능한 모든 물리적 과정에서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 바로 그것이다.
열역학 제2법칙(second law of thermodynamics)은 열적으로 고립된 계에서 거시상태의 엔트로피를 고려하였을 때, 엔트로피가 더 작은 거시상태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칙. 즉,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는 양으로 미래의 엔트로피는 지금보다 크고, 과거의 엔트로피는 지금 보다 작다.
* 엔트로피 : 계의 거시상태가 취할 수 있는 미시상태의 수에 상응하는 값
우주의 일생에서 보면 우리 우주는 이제 '항성기'로 아주 젊은 아니 어린애 수준도 못되는 상태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주는 [1. 초창기] → [2. 항성기] → [3. 축퇴기] → [4. 블랙홀기] → [5. 암흑기] → [6. 열역학적 죽음] 의 상태로 갈 것이다. 우주가 지금처럼 계속 팽창한다면 언젠가(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이 흐른 후) 절대온도 0K에 도달하여 열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물론 팽창하다가 어느순간 팽창이 멈추고 중력의 작용으로 다시 수축하여 한 점, 블랙홀 특이점이 되어 사라진다는 '빅 그런치' 이론도 있다.
'창백하고 푸른 점', 보이저1호가 지구에서 발사된지 13년 후, 지구로부터 60억 km나 떨어진 태양계 끝으로 가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했다. 이 창백하고 푸른 점인 지구에 겨우 20만년 전에 처음 출현한 인류가 이 모든 우주의 비밀을 알아냈다니 정말 경의로울 따름이다.
경의로운 우주를 이해해가는 인간의 우주를 탐험하려는 본능적 욕구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이지만 우리가 곧 우주이다.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화가 만들어낸 '지상 최대의 쇼' (0) | 2025.03.21 |
|---|---|
|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 (1) | 2025.02.20 |
| 우리는 이러했다. 상식 (2025. 2. 4) (1) | 2025.02.06 |
| 울산 알라딘 중고서점(2025. 2. 1) (0) | 2025.02.03 |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2025. 1. 14) (0) | 2025.01.14 |